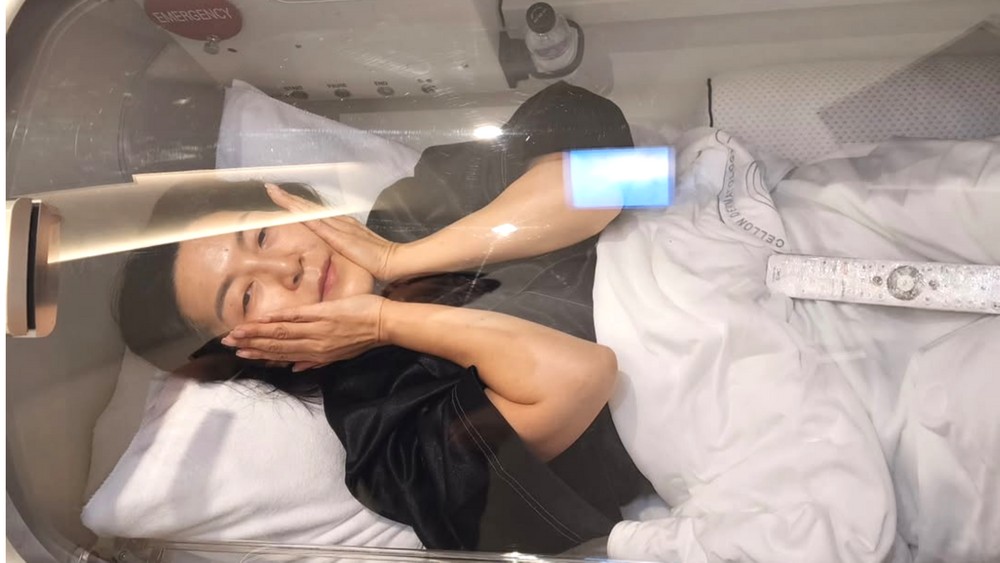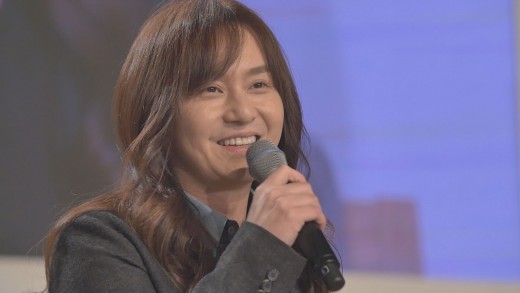미국이 장기간 주력으로 운용해 온 AIM-120 AMRAAM은 그동안 신뢰성과 실전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사거리 4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7과 R‑37M을 실전 배치하면서 그 한계가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이 왜 여전히 AMRAAM을 주력으로 유지하면서도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MRAAM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교전 시대의 새로운 환경이 기존 교리를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AMRAAM은 다양한 항공기와 방공 시스템에서 운용될 정도의 뛰어난 범용성을 갖춘 미사일이며, 발사 후 망각 기능을 제공해 조종사 생존성을 높이는 등 실전적 가치는 여전히 확고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사거리, 종말 단계 기동성의 한계, 그리고 극초음속 표적과 첨단 전자전 환경에 대응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반면 중국의 PL-17과 러시아의 R‑37M은 4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거리를 기반으로 원거리에서 조기경보기(AWACS), 공중급유기, 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을 노릴 수 있어 미국·동맹국 항공전에 새로운 압력을 가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미국은 장거리 공대공 전력 강화를 위해 다층적 개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AIM-260 JATM은 AMRAAM과 유사한 크기로 F-22와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 가능한 동시에, R‑37M 이상의 사거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LREW(Long-Range Engagement Weapon)처럼 본격적인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 단계에 있으며,
향후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연계해 공대공 교전 거리를 800~1,000k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미사일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미래 항공전 환경 전체를 재편하려는 대규모 전력 혁신에 가깝습니다.
실전 배치된 전력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미국 해군의 F/A‑18E/F 슈퍼호넷 블록 III는 레이더 단면적(RCS)을 추가로 줄이고 생존성을 크게 개선해, 탐지 성능이 강화된 중국 J‑20조차 상당히 근접해야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슈퍼호넷 블록 III는 J‑20에게 더 이상 쉬운 표적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며, 특히 AIM‑174B 장거리 공대공 능력과 결합하면 460~600km급 교전 능력을 갖춘 ‘비(非)스텔스 장거리 저격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스텔스 전력인 F‑35와 B‑21은 중국 전투기들이 먼저 탐지해 PL‑15나 PL‑17을 발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극도로 낮춘 RCS는 중국 공군 레이더가 스텔스기 접근을 초기 단계에서 포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며, 이는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먼 거리 선제 격추’ 전략을 크게 제한합니다.

중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대형 플랫폼 사냥용으로 개발했음에도, F‑35나 B‑21급 스텔스 자산을 상대로는 실질적 교전 개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략적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AMRAAM의 입증된 신뢰성과 범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AIM‑260·LREW·AIM‑174B·유무인 복합 전력 등 장거리·초장거리 교전 환경을 주도하기 위한 전력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이기는’ 공중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거리 자체가 이제는 100km대에서 600km, 더 나아가 1,000km 영역으로 확장되는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미군의 이러한 다층적 대응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상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공중전 지형 자체를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